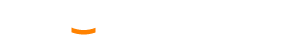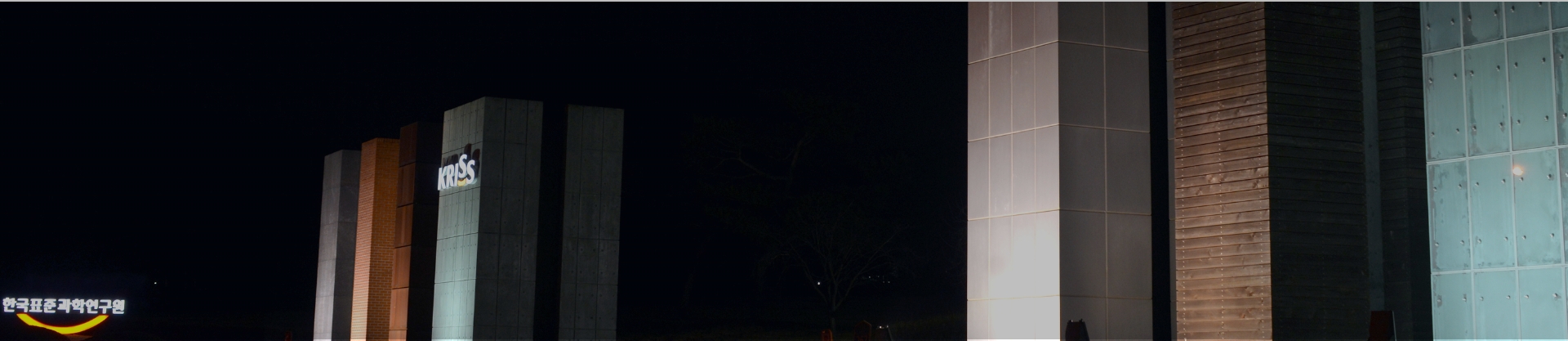KRISStory
TOP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20-01-06 13:47
- 분류지식을 나누다
- 조회수12859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해서 하면 훨씬 쉽다는 뜻의 우리 속담이다. 비슷한 서양 속담도 있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즉 ‘한 사람의 머리 보다 두 사람의 머리를 합하면 낫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속담이 물리적인 힘을 나누어 맡는 것에 비중이 있다면, 서양 속담은 지혜를 모으는 것을 강조한 점이 조금 다르다고나 할까? 또한, 성경의 전도서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하므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속담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 진리인 것 같다. [글: 박용기 KRISS 초빙연구원]
백지장의 의미
여기서 백지장은 무엇을 뜻할까? 말의 뜻 그대로라면 흰 종이 한 장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종이 중 어떤 종이를 뜻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창호지를 문에 바르고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이나 지금도 그런 한옥에서 사는 사람들은 백지장이 문에 바르는 커다란 창호지 한 장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창호지 한 장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긴 해도 옛날부터 내려온 가장 기본적인 문창호지는 77 cm x 146 cm이고, 요즘 지물포에서 옛날 창호지로 파는 크기는 64 cm x 94 cm이다. 제법 큰 종이이긴 하지만 무게가 고작해야 10 g 내외로 가벼워 둘이 들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문에 바르기 위해 풀칠을 하는 과정과 풀을 칠한 창호지를 들고 문에 울지 않고 정확하게 붙이는 일은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이 된다.
어릴 적 시골의 초가에 살던 나는 늦가을 찬 바람이 불 때면 어머니께서 방문을 떼어 때가 묻고 구멍이 뚫린 헌 창호지를 뜯어내고 새 창호지를 붙였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풀칠한 창호지를 혼자서 들어 문에 붙이려면 쳐지거나 접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어린 나였지만 내 도움이 꼭 필요했던 작업이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체득한 바 있다.
종이의 규격과 계산법
요즈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사지의 크기는 A4 사이즈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다양한 종이 크기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종이 크기의 규격은 국제 표준인 ISO 216이다. 이 규격의 기본은 가로와 세로의 비가 ‘1: 2의 제곱근’이다. 즉 가로와 세로의 비가 1: 1.4142다. 즉 전지라고 부르는 A0 크기(841 mm x 1189 mm, 1 m 2 )로부터 출발하여 전지를 한 번 접어 2등분 한 크기를 A1 크기(594 mm x 841 mm)라고 하며, A1 크기의 종이를 다시 한번 접어 2등분 하면 A2 크기(420 mm x 594 mm), A2 크기의 종이를 다시 한번 접어 2등분 하면 A3 크기(297 mm x 420 mm), A3 크기의 종이를 다시 한번 접어 2등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A4 크기(210 mm x 297 mm)의 종이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A 시리즈가 구성되어 있다. A 옆에 있는 숫자를 n이라 하면 1/2n을 계산해 보면 전지(A0)와의 크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즉, A1은 A0의 1/21, 즉 1/2 크기, A2는 A0의 1/22, 즉 1/4 크기, 그리고 A4는 A0의 1/24, 즉 1/16 크기가 된다. ISO 규격에는 이 밖에도 B 시리즈나 C 시리즈도 있다. 미국 등 북아메리카에서는 인치 기반의 조금 다른 규격도 사용한다. 즉 레터(letter) 크기는 8.5 인치 x 11 인치(216 mm x 279 mm), 리걸(legal) 크기는 8.5 인치 x 14 인치(216 mm x 356 mm) 등이 있다.
종이의 중량을 말할 때는 ‘평량’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평량은 종이 1 m
2
당의 무게를 의미하며 g/m
2
를 의미한다. 또한 1연(ream)은 종이 500 매를 의미하는 단위이다. 평량이 80 g/
m
2
인 A0 크기의 종이라면 1연의 무게는 (0.08 kg/m
2
x 1 m
2
x 500)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40 kg이 된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한 종이
종이의 발명은 우리 인류에게 지식을 기록하고 널리 전하여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능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터득한 지 식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였다. 기록의 역사는 동굴의 바위에 새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후에 대체품이 발명되기까지 무려 3천 년 동안 점토판을 사용하였다.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점토판은 무겁고 깨지기 쉬워 휴대성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 후 이집트 등에서는 습지에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이용해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파피루스는 잘 부서지고 일부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기록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후 양가죽을 이용한 양피지가 사용되었다. 양피지는 휴대성 등은 우수하였지만 책 한 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200마리의 양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당히 고가의 재료였기 때문에 이 역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기록 재료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볍고 저렴하며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원하고 있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의 영어 이름인 페이퍼(paper)가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파피루스(papyrus)로부터 왔지만, 진정한 종이는 중국으로부터 발명됐다. 중국에서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 간독(簡牘)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간(簡)은 대나무를 세로로 쪼개어 만든 것으로 모양이 길고 납작하게 만든 ‘죽간’을 말하고, 독(牘)은 나무를 쪼개어 유사하게 만든 ‘목독’을 이르는 말이다. 왕실에서는 글을 쓰는 흰 비단(겸백)에 글을 쓰기도 하였다. 그런데 비단을 기록의 매체로 사용하던 중국 왕실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컸다고 한다. 105년경, 후한의 채륜이라는 왕실의 재정을 담당했던 환관은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중구난방으로 만들고 있던 종이 제조법을 체계화해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3세기경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알려졌는데, 그 이전에는 자작나무의 흰 껍질을 얇게 벗긴 것을 종이처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종이가 유럽에 전해진 것은 그후로도 한참 뒤인 1100년대이다. 중국의 제지법은 700년대 중반에 이슬람 문화권에 전해지고 이 기술 이후에 유럽으로 전해졌다.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었으며 13세기까지도 유럽의 많은 왕이 글을 읽을 줄 몰랐다고 한다. 유럽은 제지 기술은 늦게 받아들였지만, 본격적인 제지공장을 만들고 저렴하게 종이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이가 인류 문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가장 먼저 진가를 발휘한 것은 인쇄술의 출현과 합쳐져 성경을 인쇄하여 대중들에게 전파하게 된 일이다. 이후 종이는 종교뿐만 아니라 학문, 사상, 산업, 예술 등의 발전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지의 과학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 인쇄물은 1,300여 년 전에 신라에서 만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는 불경이라고 한다. 불국사의 석가탑 사리함에서 발견된 한지로 만든 두루마리다. 서양의 종이 제작 기술로 만든 요즈음의 책들은 고작 50년에서 100년 정도만 되어도 색이 변하게 되는데, 닥나무로 만든 닥종이에 인쇄된 불경이 1,300년이 지나도록 형체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종이의 기본 재료는 셀룰로오스(cellulose)라고 하는 식물성 섬유다. 셀룰로오스는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에 들어가 물속의 산소와 수소를 만나 서로 결합을 함으로써 종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게 된다. 종이의 원료가 되는 식물 속에는 식물 섬유 외에도 리그닌(lignin)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섬유를 강하게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되어 누렇게 변하게 된다.
한지는 닥나무를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진다. 닥나무의 섬유는 길이가 보통 20 mm ~ 30 mm 이고, 긴 것은 70 mm까지도 있다. 서양 종이는 목재 펄프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섬유의 길이는 침엽수의 경우 2.5 mm ~ 4.6 mm, 활엽수의 경우 이보다 더 짧아 0.7 mm ~ 1.6 mm 정도이다. 그러므로 닥나무로 만드는 한지의 섬유 결합이 강하고 질겨 강도가 우수한 종이가 된다. 또한,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는 시간에 따라 변색하는 리그닌의 성분이 매우 적어 종이가 부드럽고 시간이 오래되어도 변색 되지 않는다. 또한, 서양 종이는 원료가 산성(pH 4.0 이 하) 을 지니고 있는 반면, 한지는 산성도가 pH 8.0 부근의 중 성지로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결이 고와지고 변색이 되지 않아 수명이 길다. 한지를 만들 때 식물성 섬유들이 서로 잘 달라붙어 치밀하게 만들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닥풀이라는 식물이다. 닥풀 속에는 당과 녹말이 많이 들어 있어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한지는 제조 과정이나 강도 그리고 보존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속담에 나오는 문창호지로써 기능 면에서도 우수하다. 창호지는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어 창호지 문은 굳이 열어놓지 않아도 자연통풍이 되며, 습기를 잘 빨아들여 방안의 습도 조절의 역할을 한다. 표면에 작은 섬유 조직이 남아있어 공기층을 붙잡아 두어 보온 측면에서도 유리보다 우수할 뿐만 아니라 햇볕을 적당히 차단하여 커튼을 치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 시대에서 종이의 미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 종이로 만든 물건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전통적인 책, 신문, 프린트 용지, 복사지 등의 용도 외에도 화장지, 각종 상자, 우유팩, 커피 필터, 각종 포장지, 사진 인화지 등도 모두 종이로 만든다.
이 중 어떤 용도로 종이가 가장 많이 사용될까? 2018년에 Environmental Paper Network이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종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포장과 상자로 전체 소비의 55 %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인쇄·복사 및 프린팅 용도로 26 %이며, 문방구로 사용되는 비율은 8 %, 신문 용지는 7 %였다. 1인당 종이 소비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아메리카로 1년에 215 kg을 소비하였고, 그 뒤를 유럽,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뒤따르고 있다. 세계 상위 26개국이 전 세계 평균치의 두 배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데, 1인당 1년에 소비하는 종이량(kg)이 많은 상위 국가는 룩셈부르크(277), 독일(251), 오스트리아(249) 순이며, 우리나라는 186 kg으로 상위 11위에 올라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종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세계 종이 소비 및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쇼핑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즉 온라인으로 많은 상품이 구매되면서 이런 상품들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포장용 박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경을 생각해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를 종이로 대체하는 움직임도 있어 종이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이 역시 나무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재생용지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나무를 심는 일 또한 병행되어야만 한다.
종이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꾸준히 우리 인류와 함께 할 전망이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이 속담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갈지 궁금하다.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